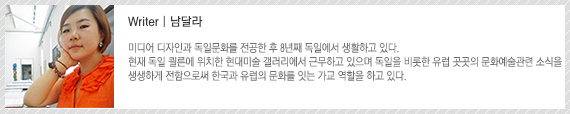완숙한 추상의 세계
남달라 독일 통신원 | 2017-04-07

2017년 2월 9일 독일 쾰른에 위치한 루드비히 미술관(Museum Ludwig Köln)에서는 현대미술의 역사로 꼽히는 대표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8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로 26점의 새로운 추상회화를 선보였다.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미술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그가 황혼의 삶을 절정으로 누리고 있을 나이 만 85세에 그려낸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해도 우리는 위대하다고 표현해야만 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 ⓒ dpa-infocom GmbH

전시전경 ⓒ Gerhard Richter: New Paintings
Museum Ludwig Cologne, 2017
Photo: Rheinisches Bildarchiv Koeln/ Britta Schlier
최근 예술의 대중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본 작품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유명 셀러브리티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예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 미술 애호가이기도 하며 직접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했던 빅뱅의 탑이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 사진을 여러 점 올리면서 그의 작품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더 해지기도 했다. 올해 초 영국 런던 소더비(Sotheby's) 경매에서는 그의 1982년작 〈빙산(Eisberg)〉이 한화 약 249억원에 낙찰되면서 생존하는 현대미술 작가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잘 팔리는 작가로써 입지를 다졌다.

루드비히 미술관 외관 ⓒ Museum Ludwig, Photo: Lee M.

2007년 7월 그가 유리창을 보기 위해 대성당을 처음 방문한 리히터 ⓒ J. P. BAchem Verlag
‘쾰른’이라는 도시와의 인연
이번 전시를 기획한 쾰른 루드비히 미술관의 일마즈 지비오르(Yilmaz Dziewior) 관장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장소로 루드비히 미술관을 선택해 준 게르하르트 리히터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전시를 미술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고하게 다져주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작가와 함께 꾸준한 인연을 이어나갈 것에 대한 굳은 의지를 전하며 전시의 막을 열었다.
현재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도시 쾰른은 그와 인연이 깊다. 1944년 공습으로 파괴된 후 투명하게 유리만 끼워져 있었던 창에 11,200개의 색 유리판을 배열, 조합해 하나의 추상적인 작품으로 재탄생 시킨 이가 바로 리히터다. 그가 만들어낸 우연일지 필연일지 모를 이 아름다운 조화는 “가히 신적인 디자인의 일부”라는 극찬을 받았다.

Abstract Painting (946-3), 2016 Oil on canvas 175 x 250 cm ⓒ Gerhard Richter 2016 (221116)
50년 이상,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회화의 화려한 부활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것이든 보이는 것에 대한 진부함의 형상과 추상 사이의 긴장에 매료되어 끊임없는 창작을 해왔을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라는 타이틀을 지금껏 가져왔을 그에게 있어 작가 자신과 그의 작품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목표도, 어떤 체계도, 어떤 경향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강령도, 어떤 양식도, 어떤 방향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지 모르겠다. 나는 일관성이 없고, 충성심도 없고, 수동적이다.
나는 무규정적인 것을, 무제약적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끝없는 불 확실성을 좋아한다 -1966년 그의 노트에서

Abstract Painting (947-2), 2016 Oil on wood 40 x 50 cm ⓒ Gerhard Richter 2016 (221116)

Installation view
Gerhard Richter: New Paintings
Museum Ludwig Cologne, 2017
Photo: Rheinisches Bildarchiv Koeln/ Britta Schlier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적어 내려간 그의 노트 문구처럼 수 십년 간 다르게 표현되었을 그의 작품에 대한 본질이 조금도 축나거나 변함없이 온전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선명한 색채가 각자의 색을 강렬하게 뽐내면서도 겹쳐지는 층 안에서 또 다른 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브러시, 주걱, 나이프와 같은 도구들로 캔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작가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묻어 있다. 그렇게 겹쳐지고 덧칠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상상하며 작가의 내면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들여다 보게 되었다. 같은 기법으로 그려진 여러 점의 작품들은 매우 흡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표현력과 의미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의 작품만의 상징 그 자체로 다가왔다.

Ema (Nude on a Staircase), 1966 Oil on canvas 200 x 130 cm ⓒ Gerhard Richter 2016 (221116)
Photo: Rheinisches Bildarchiv Köln
흐릿하지만 섬세한 움직임까지도
작가는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마치 사진과도 같아 보이도록 그림으로 그려낸다. 사물을 사진으로 찍어 형상을 그림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통해 빛 바랜 사진처럼 테두리를 흐리면서 그리기도 하는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전시에 함께 소개된 미술관의 소장 작품인 〈엠마(계단위의 누드)〉, 원제 〈Ema(Akt auf einer Treppe)〉, Oil on Canvas, 1966 작품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단순히 지나치는 사람이 보기에는 알몸을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금발의 여자 사진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순간의 작은 움직임들까지 흐릿하지만 세세하게 스치듯 그려 넣은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회화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캔버스에 재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리히터는 수많은 화가들의 시도를 비틀면서도 자신의 특유의 회화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하며 사진적 재현과 예술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작가는 어쩌면 뒤집힌 순서일지도 모를 회화의 방향을 자기만의 기법으로 부각시키며 캔버스 안에서 색의 집약의 조화를 굵직하게 풀어내고 있다.

Installation view
Gerhard Richter: New Paintings
Museum Ludwig Cologne, 2017
Photo: Rheinisches Bildarchiv Koeln/ Britta Schlier

War, 1981 Oil on canvas 200 x 320 cm ⓒ Gerhard Richter 2017 (221116)
Photo: Rheinisches Bildarchiv Köln
일생을 회화로 살아온 위대한 화가에 대한 경외감
쾰른이라는 도시에서 20년째 거주하며 쾰른에 위치한 초이앤라거갤러리 독일의 경영을 맡고 있는 최진희 디렉터(Director of CHOI&LAGER Gallery Cologne)는 “쾰른이라는 도시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그의 새 작품을 이곳에서 선보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새로운 그림들이지만 그리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았으며 85세의 원로 화가로서의 인생이 각각의 색으로 축적된 것 같았다. 일생을 회화로 살아온 위대한 화가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뿐이다. 리히터의 삶은 마치 그가 그려낸 한 점의 추상화처럼 색에 색을 덫칠하고 마르면 다시 새로운 색을 덫칠하여 완성한 하나의 작품과도 같다”고 이번 전시 관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왔을 이번 전시가 특별한 신선함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말 그대로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우는 그가 아직까지도 붓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회화의 종말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추상과 구상, 채색화와 단색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품격 있는 모습은 그가 아직도 굳건하며 지금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그리고 이 노장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글_ 남달라 독일 통신원(namdalr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