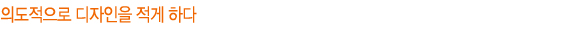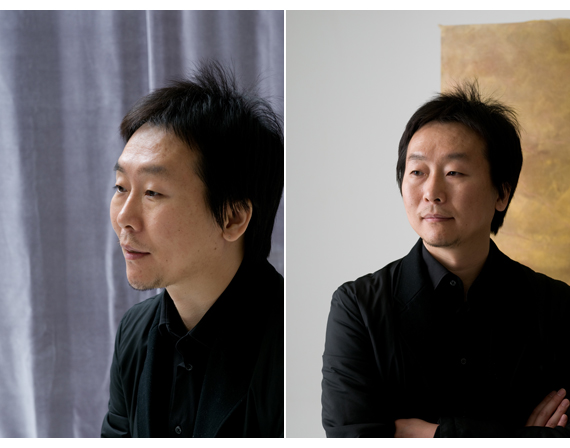Less but Better
2009-06-02
최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전자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수일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 중심에는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DMC 부문 컴퓨터시스템사업부 디자인그룹의 책임디자이너로, 모바일컴퓨터(Netbook & Note PC)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윤상원 역시 국내외 컴퓨터 시장을 리드하는 숨은 주역이다.
에디터ㅣ 박현영(hypark@jungle.co.kr), 사진ㅣ 스튜디오salt
계명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윤상원은 뉴욕에 위치한 아트 & 디자인 예술대학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을 전공했다. 국내에서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기에 그의 도전이 낯설지만은 않았다. 대학원 동기들 중 학부와 전공이 같은 사람은 한국인들 뿐이었다고 술회한 그는 마치 유학을 결심하고 실천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졸업 후 4년 간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윤상원은 2001년 또 한번의 기회를 자신의 운명으로 맞바꾸었다. 삼성전자에서 해외인력을 채용하는 기회가 생겼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있던 그는 곧 삼성 뉴저지 법인에서 인터뷰를 가졌고 이후 2001년 가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다.
컴퓨터시스템사업부 디자인그룹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인가. 그리고 입사 후 포지션이나 업무는 어떻게 달라졌나
Desktop PC, Note PC, Netbook, UMPC 등 각종 컴퓨터 제품을 디자인하는 부서이다. 제품디자인뿐만 아니라 UI와 그래픽디자인 업무도 수행한다. 처음에는 데스크톱 디자인을 했었고, 2005년도부터 노트 PC 디자인을 하다가 작년부터 넷북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아이템을 경험해볼 수 있었고 삼성에서 출시된 PC 관련 제품은 상당부분 관여를 한 셈이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에이전시에 소속된 디자이너와 작업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디자이너의 프로세스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에이전시와는 분명히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 에이전시는 디자인만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인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즉 양산까지 모두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인하우스 조직이 크다 보니 디자인 기능에서도 팀이 세분화 되어 있다. 디자인 전략 및 리서치 등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어, 제품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서포트를 많이 받는 편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는 편인가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외는 작업에 있어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다. 서로의 장점을 주고 받으면서 일하는 반면, 국내는 작업 스타일이 조금 더 개인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의 경우에는 작은 프로세스라도 팀워크로 작업하지만,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붙어서 하다 보니 특정 개인의 역량이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국내 디자이너들의 업무량이 훨씬 많은데 반해, 디자인을 개발하는 기간은 짧다. 그렇기에 디자이너의 역량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국내 전자 제품이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다. 기업들이 그 동안 디자인에 집중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지난 80~90년대 디자인관련학과가 많이 생기면서 디자인 인프라가 강화되었고 정부 및 사회 전체가 디자인에 투자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자 제품 매장을 가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한국 상품이 있을 정도다. 한국 상품은 ‘reasonable’하다는 것이 해외의 반응이다. 즉, 적당한 가격과 좋은 디자인, 그리고 좋은 퀄리티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한국제품이 디자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해외 수출 시 국내보다 더 강화된 규제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규제가 많다. 특히 유럽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절전, 서스테이너블, 에코 등이 최근 떠오르는 디자인 이슈들이다. ‘에너지스타’ 인증은 기본이고 재료 및 페인트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규제가 많고 또한 지역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해 고려할 요소가 많다.
“Less is more” 라는 말이 있다. 미스 반 데어 로어(Mies Van Der Rohe)가 한 말인데 즉,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상원에게 굿디자인은 무엇일까?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브라운(Braun)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Dieter Lams가 말한 “Less but Better” 이라고 그는 말한다. ‘Less 디자인’, 즉 단순히 조형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이 굿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디자인 개발 전반에 걸쳐 문제해결을 할 때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적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Better 디자인’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조형적 단순함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관적 사용성을 전달한다든지, 의도하여 제품의 파트수를 줄이고 재료를 적게 사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결국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디자인과도 연관이 된다. 과거에는 디테일을 살려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디자인한 반면, 현재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폐기까지 고려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더 나은 디자인을 확보하는 것이 굿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어떤 제품들을 출시했나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출시한 노트 PC ‘R700’과 올해 4월 말에 출시한 넷북 ‘N120’이다. 노트 PC R700은 17인치 노트북으로 디자인 시 고려했던 부분은 역시 차별화였다. 조형적으로 제품을 슬림하게 디자인하였고, 플라스틱 표면을 텍스쳐와 고광택 부분을 조화롭게 믹스하여 스프레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였다. 넷북 N120은 10.1인치 제품으로 제품사이드에 크롬 디테일을 이용해 슬림 룩을 구현하였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반짝거리는 즐거움을 주고자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PC 제품의 트렌드나 동향은 어떻게 보는가
세계적으로 PC 시장의 화두는 넷북이다. 이유는 모바일 환경과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컴퓨팅 기능을 가지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빼다 보니 가격이 기존 PC보다 저렴하고, 이동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넷북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통신과의 결합이다. 이러한 넷북의 성장은 당분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초저가 제품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고성능의 프리미엄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겠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성능만을 지닌 넷북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제품디자이너의 역할도 변화되었는가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 디자이너가 변화해야 될 부분은 꼭 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과거에 PC는 컴퓨팅이라는 자체가 학업이나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조금 더 퍼스널(personal)해졌다. 모바일폰처럼 개인중심이 되다 보니,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변화되었다. 10년 전 회색과 실버가 일색이던 PC의 컬러도 화이트나, 레드, 블랙 등과 같이 다양해졌고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나 아이콘이 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디자이너의 마인드나 디자인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하긴 하다.
PC 디자인이 다른 전자 제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PC는 일반 전자 제품과 달리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물건이다 보니, OS, 칩셋, 그래픽회사도 고려해야 하고, LCD, 메모리 회사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애플처럼 독자적 노선을 가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PC 메이커가 시장을 드라이브할 수 것은 아니다. 다른 분야보다 재료비가 높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디자이너들은 영역을 구분 짓기 보다는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순수 미술과 아트,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듯이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인 창작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윤상원은 말한다. 아티스트와 제품 디자이너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제품디자인은 development 과정의 연속이며 반복이라는 것이다. “즉흥적인 아이디어 보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화려한 스타일링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치우친다면 현실과의 괴리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충고한다. 또한 대기업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기업, 특히 전자 쪽의 디자이너로서 대외활동을 하는데 적잖은 제약이 있을 듯 하다. 대기업에 소속된 디자이너로서 득과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외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볼 때 그들의 열정을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역할만 하기에도 벅차 대외활동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외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 또한 기업에 속한 디자이너로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수많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의 대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 팁을 준다면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강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디자이너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스페셜티를 가져야 경쟁력을 갖는다. 그것이 스케치를 잘하든, 3D 스킬이든, 외국어이든, 남들보다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 요즘은 국내파들이 외국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국내뿐만 아니라 밖으로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제품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제품디자이너가 되려면 다방면에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엔지니어링적인 지식이라던가,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제품디자이너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트렌드만 쫓으면 안된다. 아이디어를 빼고 나면 컨셉트나 디자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즉흥적인 아이디어 보다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제품디자이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