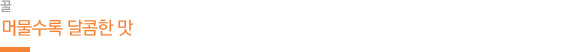머물수록 달콤한 맛
2011-02-23
창문에 남아있는 끈끈이가 만들어낸 ‘웰빙짬뽕’과 ‘짜장’이라는 글씨의 자국이 제법 세다. 연필과 크레용 등의 필기구로 낙서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천정. 한쪽에 남아있는 때탄 벽지 위에는 빨간 크레용으로 그려진 공주그림과 ‘빨리 줘’, ‘우리 사이’와 같은 글자들이 있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두 팔이 흐느적거리는 풍선인형은 고사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 흔한 간판도 없는 이곳은 ‘꿀’이다. 뭐? ‘꿀단지’? 보면 볼수록 좋고 보물이 가득 찬 곳이니, 그래, 꿀단지도 맞는 말이다.
에디터 | 최유진(yjchoi@jungle.co.kr)
전체적으로 허름하고 세월이 좀 된듯한 건물, ‘꿀’이 위치한 곳은 한남동이다. 소위 ‘삐까리뻔쩍’하고 고급승용차만 서있는 건물들이 즐비한 한남동. 도로 하나 건너로는 리움미술관이 있는 그 곳에 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이 무얼 하는,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미리 습득해 놓은 정보가 없다면 발을 들여놓기가 조금 망설여 질수도 있다.
이 공간을 만든 사람은 작가 최정화 씨다. 아티스트, 디자이너, 미술감독, 기획자 등 수많은 직함이 있는 그는 플라스틱 소쿠리를 쌓아올리고 커다란 가짜 꽃을 만들어 설치하는 그 작가, 최정화다.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그 이름이 실릴 정도로 유명한 작가인 그는 일 년의 반 이상 해외로 불려 다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보이는 모든 것’을 디자인했던 가슴시각개발연구소 소장이었던 그에게 작업량이 부족했던 것일까. 안 그래도 바쁜 그가 이러한 공간을 만든 이유가 궁금했다. “원래 창고로 쓰려고 이 공간을 선택했는데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과 ‘같이 쓰자’ 했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제 작품인데 창고에 넣어두면 어차피 먼지만 쌓이고. 이렇게 두니까 좋잖아요. 여기 말고도 창고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요. 지난해 4월에 풀의 공간을 리노베이션하는 작업을 하며 이곳을 함께 꾸몄어요.” 기존의 건물이 가졌던 골격 그대로인 이 공간에 수정이 가해진 곳은 없다. 기둥과 천정, 바닥 모두 그대로다. 다만 몇 군데 벽면에 반듯하지만 낡게 합판을 댄 것을 제외하고. “건축가 없는 건축, 자생적, 자발적 건축. 이런 공간들은 전문가들이 못 만들어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만드는 문화, 민간인 문화죠. 민간신앙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좋아 여기로 왔고 그게 효력을 발휘한 거고. 이곳 천정은 ‘근대문화유산’이에요.”
‘꿀’로 들어와 처음 마주하는 곳은 커피와 차, 맥주 등을 판매하는 카페다. 구석구석이 최정화 작가의 작품들이다. 의자도 테이블도 그의 작품이다. 개중엔 재활용가게에서 구입한 것도 있다. 카페 가운데에 자리한 단체석은 핑크빛 꽃무늬 의자로 빛이 난다. 중국집이 이 공간을 떠날 때 그들로부터 구입한 것이란다. 여러 물건들이 모두 볼거리지만 백미는 화장실이다. 빨간 구슬들로 장식된 화장실은 작은 아방궁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볼일’이다. 환상적인 기분의 ‘볼일’.
지하와 2층에는 여러 공간들이 나뉘어져 있다. 문은 없지만 각각이 모두 작가들의 작업실이다. 모두 네 팀의 작가들에게 공간을 나누어주었다. 그에 의해 선정되는 작가들은 대략 6개월간 이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곳의 성격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성격 없음, 기준 없음, 룰이 없음, 바뀔 수 있음, 다만 작가 위주”라 답했다. 기획자나 큐레이터 위주가 아닌 작가 위주로 운영되는 공간. “작가들과 같이 쓰는 공간이면서 창고 겸 오전엔 사무실, 오후부턴 커피숍, 술집. 창고를 개방해 놓은거죠.” 실제로 꿀의 지하는 그의 작품으로 가득 차있는 창고이고 바로 옆엔 ‘꽃땅’이라는 술집이 있다. 그곳도 꿀의 일부로 네 명의 작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꿀’에 가면 ‘카페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술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가 된다.
‘꿀’은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된 바 있다. 그래서 외국인 손님도 많다. 서울에 오면 리움에 갔다가 이곳에 들러야 한다는 방칙 같은 것이 생기기도 했다. 그들의 반응은 뜨겁다. “다른 곳은 다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한국적이고 아방한 곳이 없으니까 여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한국적 키치가 담긴 그의 작품에 대한 반응도 외국인들이 더 뜨겁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곳처럼 뺀질뺀질하게 가꾸고 단장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성형왕국인데 여기는 딥클린징만 해놓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워하는 핑계가 많아요. 싹도 누르려하고.” 하지만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이루어진 물건들과 싸구려 비닐가방들, 키치를 좋아하는 것은 그게 키치여서가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다. “키치는 시각적인 것 뿐 아니라 문화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회, 정치, 교육,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너무 복합적이죠. 꼬마 애들이 와서 ‘우와, 좋다’, ‘볼 거 많아요’ 하는 걸 보면 감성뿐 아니라 DNA 같은 거란 생각이 들어요, 원형질. 이곳을 좋아하시는 단골 할머니도 계시고, 한번은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곳이 좋은 이유를 하나하나 저에게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이곳을 좋아하는 것도 이런 공간이 흔치 않기 때문이고 뺀질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공간이 좋은 거지요.” 음악도 완전 짬뽕이다. 클럽에서 무아지경 상태로 들을 때 딱 좋은 음악부터 ‘아리랑 아줌마’라 불리는 옛날 가수의 노래와 시골 장에서 들릴만한 제대로 뽕짝인 음악도 나온다. 듣고 있으면 신이 나고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뺀질한 곳’과 감성이 빽빽히 붙어 있는 이곳은 반대의 개념을 지니지만 상생하는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리움과 이곳을 함께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거고 서로 좋은 거예요.” 지난해 리움은 새롭게 전시를 개최하면서 오픈파티를 이곳에서 열기도 했다.
시스템에 반反하고 사회에 반하고 획일화에 반하는 공간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최정화 작가가 이곳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르다. “답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현대미술에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가장 나쁜 거라 생각해요. 설명서는 절대 없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의 조합이죠. 1 더하기 1은 2지만 1 곱하기 1은 무한대예요. 더하기를 살짝 돌리면 곱하기가 되죠. 눈이 부시게 하찮은, 쓰잘 데 없는 것에 대한 예찬, 쓸모없으면서 쓸모없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 자체로 예쁘고 좋은거죠. 제 작업은 기념 촬영의 대상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의미는 나중에 붙여도 되고 내가 안 붙여도 되고. 작가는 말 못해도, 글 못써도 되고 작품으로 이야기하면 되고요. 좋은 건 말이 필요 없죠.”
꿀은 기존의 모습에 더해진 최정화 작가의 손길을 통해 ‘최정화 화’된 공간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흔적들이 더해진다.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작가들의 전시가 그것. 다른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가 열리면 그의 공간은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전시기획 및 디렉팅을 통해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 또한 그의 작업인 셈이다.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독보적인 작가는 옛날 개념이죠.”
이제 곧 꿀은 재미난 공연들로 바빠진다. 퍼포먼스, 음악공연, 패션쇼,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2월 25일 금요일에 열릴 오승열 작가의 전시 ‘혼자하는 그룹전’ 오프닝 파티에서는 ‘요리, 조리, 소리’라는, 요리로 이루어지는 공연이 마련된다.
이곳의 계약기간은 3년. 그 후에는 꿀이 어떻게 될지,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 이후엔 부시고 새로운 걸 지으려고 하겠죠. 공간 자체가 워낙 좋아서 없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3년 후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3년 후를 걱정하기에 지금의 ‘꿀’은 너무 아름답다. 신나게 작업하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근대문화유산이 살아있고 누군가의 흔적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생동감 넘치는 곳, 수많은 보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많이 이 아름다움을 즐겨야만 한다.
www.choijeonghwa.com
꿀